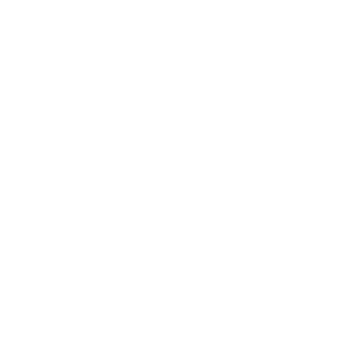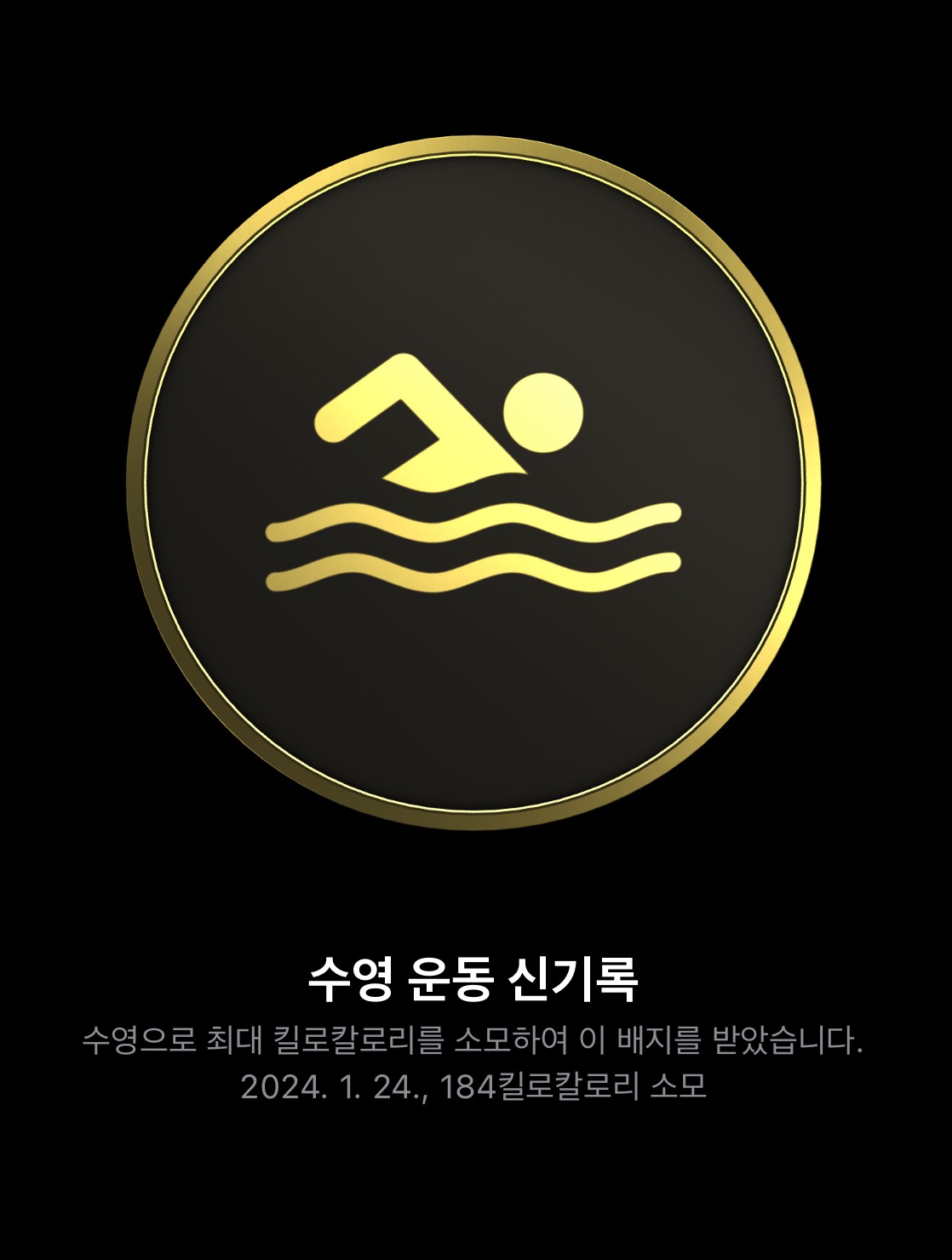[구지가]
거북아, 거북아
머리를 내어라.
내어놓지 않으면
구워서 먹으리
- 갈래 : 주술요, 집단 무가, 4구체 한역 시가, 노동요
- 성격 : 1) 집단적 - 가락국의 백성들이 수로왕을 기다리며 함께 부른 노래로 집단적 성격을 드러낸다.
2) 주술적 - 새로운 왕(수로)을 맞는 제사의식에서 부른 노래로 거북에게 명령, 위협을 통해 그 소원을 이루었으므로 주술적 성격을 드러낸다.
- ‘영신군가’라고도 부름. ‘영신군가’란 임금을 맞이하는 노래라는 뜻이다.
- 표현 : 명령 어법, 진설적 표현, 가정법, 위협적 어조
- 제재 : 거북
- 주제 : 수로왕의 강림 기원
- 의의 : 현전하는 가장 오래된 집단 무가이다.
1구 - 거북아, 거북아 => “호명” 거북을 호명하며 부름.
2구 - 머리를 내어라. => “명령” 머리를 내밀라고 요구하는데, 거북의 머리는 예로부터 생명을 뜻하는 것으로 수로왕의 탄생을 상징적으로 드러냄.
3구 - 내어놓지 않으면 => “가정” 가정적 상황을 제시함
4구 - 구워서 먹으리 => “위협” 구워먹겠다고 위협함으로써 구성원들의 소망을 강하게 드러냄. 소망 실현/관철에 대한 의지.
🧚🏻 <구지가>는 삼국유사의 가락국기에 기록된 한역시가입니다. 가락국기에 따르면 새로운 왕을 기다리는 제사의식에서 거북에게 머리를 내놓으라는 노래를 부르자 가락국의 시조, 머리 ‘수’, 나타날 ‘로’의 수로왕이 태어났다는 배경 설화가 존재합니다. 그리고 이 시기로부터 700년이 넘는 시간이 흘러 8세기 초 신라 성덕왕 때 불려진 <해가>라는 노래가 존재하는데, <구지가>와 <해가>는 매우 유사하여 곧 잘 비교를 하곤 합니다.
[해가]
거북아 거북아 수로를 내 놓아라.
남의 아내 앗은 죄 그 얼마나 큰가?
네 만약 어기고 바치지 않으면,
그물로 잡아서 구워 먹으리. 🧚🏻 여기서 등장하는 ‘수로’는 가락국의 수로왕이 아닙니다. 물 ‘수’, 길 ’로‘의 수로부인을 말하는데, 수로부인이 경주에서 강릉 가는 도중 해룡에게 납치를 당하자 사람들이 땅을 파며 <구지가>와 비슷한 노래를 불렀습니다. <구지가>와 <해가>를 비교해볼까요?
[구지가와 해가 비교]
공통점
- 모두 위협과 협박의 어조를 사용하고 있다.
- <구지가>는 가락국의 왕을 맞이하며 소원을 이루고, <해가>는 수로 부인을 되찾으며 소원을 이룬다.
차이점
- 노래의 목적이 <구지가>는 국가의 임금을 맞이하는 공동체의 목적이라면, <해가>는 수로부인을 되찾기 위한 개인적 목적이다.
- <구지가>는 위협에 대한 근거가 없지만, <해가>는 ‘남의 아내 앗은 죄 그 얼마나 큰가?’라고 하며 근거를 제시하며 위협하고 있다.
🧚🏻 <구지가>와 <해가>는 거의 똑같은 내용으로 소망을 표현하는데, 차이점이 있다면 그 근거를 제시하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가장 큰 차이입니다. 700년의 시간차이가 존재하지만 이렇게 거의 동일한 노래가 존재한다는 것 자체가 우리 시가가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면서 계속해서 우리 공동체 안에서 향유되어 왔다는 증거가 아닐까 하고 생각해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