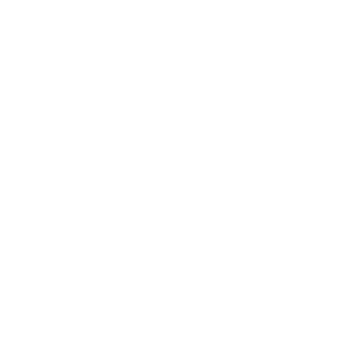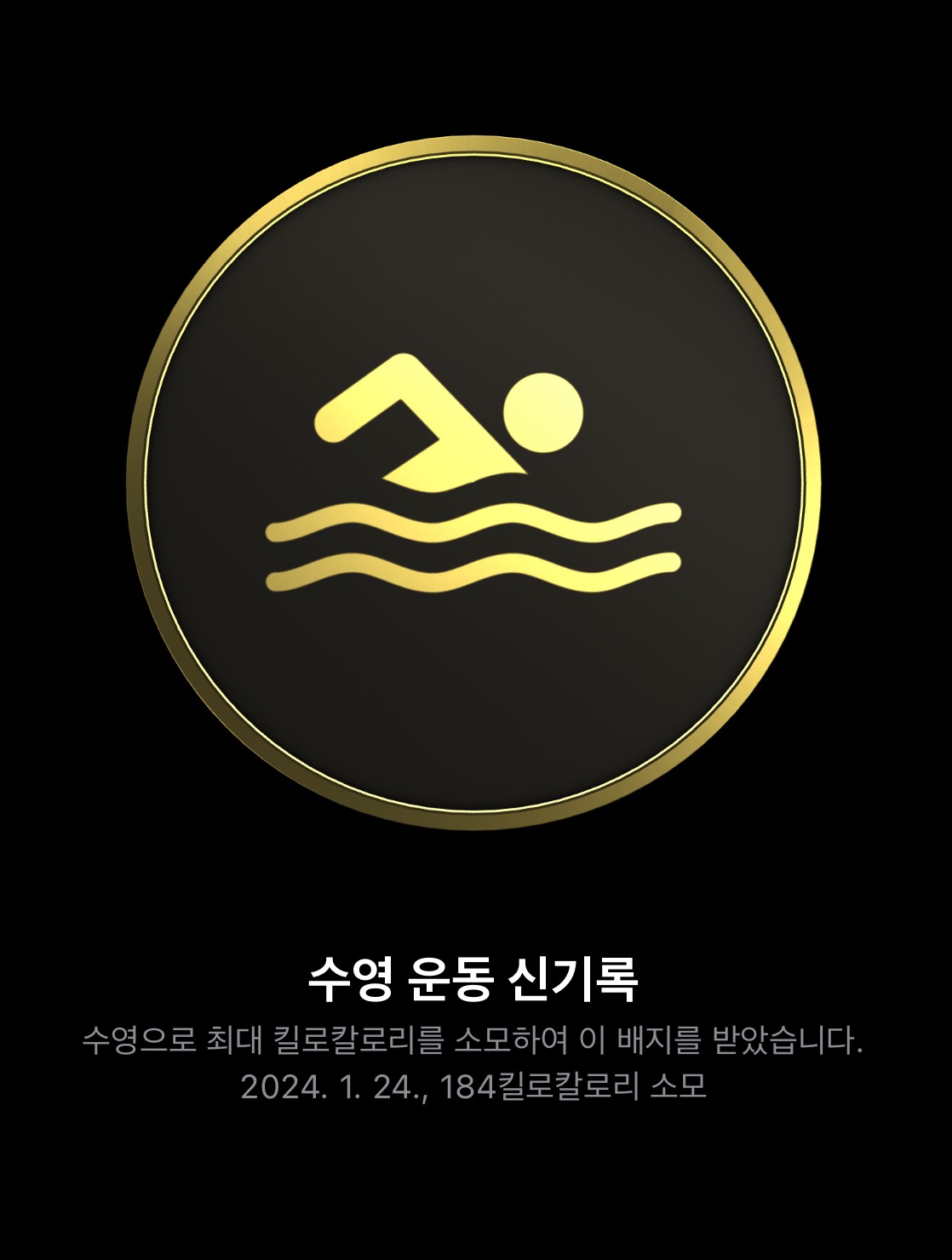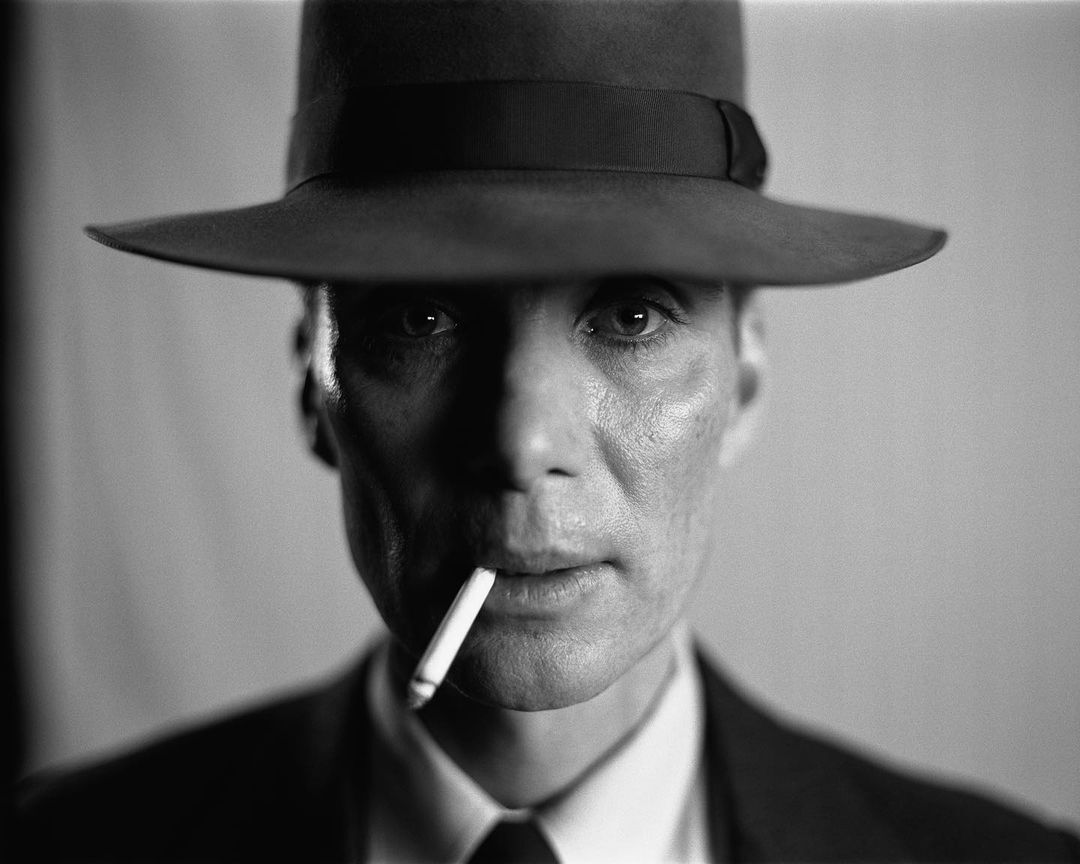임이여, 물을 건너지 마오.
임은 그예 물을 건너시네.
물에 휩쓸려 돌아가시니,
가신 임을 어이할꼬.
- 갈래 : 고대 가요, 한역 시가, 서정시
- 성격 : 서정적, 애상적, 체념적
- 형식 : 4언 4구체
- 제재 : 물을 건너는 임
- 주제 : 임을 여읜 슬픔
1. <공무도하가>의 이해
<공무도하가>가 언제부터 전래한 노래인지, 어느 나라의 노래인지에 대한 입장은 사실 명료하지 않다. 그 입장에 대해 아래 책들에서는 이렇게 밝힌다.
- <공무도하가>는 단군이 세운 우리나라 최초의 국가인 고조선의 노래로, 문헌상 가장 오래된 서정 가요입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문헌보다 중국 후한 말 채옹이 역은 [금조]와 송나라 때 곽무천이 엮은 [악부시집]에 먼저 수록되었기 때문에 후대인들이 안타까움을 느끼는 노래입니다. 우리나라 문헌으로는 조선 정조 때 한치윤이 엮은 [해동역사]라는 책에 이 노래가 실려 있는데, 고대 가요가 존재하던 때에는 우리글이 없었으므로 구전된다가 한자로 정착됩니다. (청소년 고전문학사, 21쪽)
- <공무도하가>는 중국의 문헌에 기록되어 전해진 것이다. [각주:중국 진나라 시대(3~4세기경)에 최표라는 사람이 중국 여러 지역의 노래를 모아 펴낸 <고금주>라는 책에 실린 것을 조선시대의 학자들이 보고 기록함으로써 알려진 노래다. 그래서 중국 노래 아닌가 하는 의민이 제기되기도 하지만, ‘조선’은 곧 ‘고조선’일 수 있고, 중국 직례성에 조선인들이 독자적인 문화를 이루며 모여 살던 지역이 있었다는 것을 근거로 하여 한국의 문학으로 본다.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중국 쪽에 이런 노래가 전해지고 기록된 것은 우리 노래가 그만큼 널리 전파되어 있었다는 증거로 보기도 한다.] (한국문학강의, 조동일 외 공저, 218쪽)
- <공무도하가>는 고조선 멸망 이후 수백 년이 지나 중국 측 기록에 처음 등장했어요. 이 노래를 얹어 불렀다는 공후라는 악기도 중국 쪽에서 많이 활용하였고, 한국에서는 조선 중, 후기 넘어서야 이런 작품이 있는 줄 알게 되었기 때문이에요. 그래도 고조선의 시가가 하나도 없으면 서운하기도 하고, 나름 한국적인 한을 보여주는 작품이라고 저도 종종 수업에서 다루곤 했지만요. / 중국에서 한복을 비롯한 한국 문화에 대한 무리한 공정을 자꾸 하는 것을 보면, 우리도 이제부턴 좀 엄밀하게 생각해야 할 것도 같습니다. 지금까지의 관행 탓에 <공무도하가>가 아예 한국의 작품이 아니라고 하기도 난처하지만, 꼭 필요한 자리가 아니라면 이 작품을 한국 최초의 시가라고 단정하기도 어렵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판단을 유보합니다. (서철원, 고전 시가 수업, 24쪽)
위의 내용들을 고려한다면 <공무도하가>가 우리나라 최초이자, 가장 오래된 노래라는 입장에 대해서는 살짝 물러서서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대부분의 교과서, 문학교양서에서 우리나라의 노래로 관점을 두고 정보를 정리하지만 <고전 시가 수업>의 교수님은 한국 최초의 시가로 단정하기 어렵다는 의견을 보였기 때문이다. 그래서 <공무도하가>를 바라볼 때, 문학사적 입장을 명료하게 구분하기 위해 노력하기 보다는 고대의 우리의 서정을 이렇게 노래한 시가가 있을 것이다라는 정도로 생각하며 내용과 표현에 집중하여 내용을 이해하는 것이 좋다.
2. 배경 설화
고대가요에 속하는 <공무도하가>는 문헌에 기록되는 과정에서 배경설화와 함께 기록되어 이 노래가 불려진 맥락을 노래와 함께 확인할 수 있다.
공후인은 조선의 진졸 곽리자고의 아내 여옥이 지은 것이다. 곽리자고가 새벽에 일어나 배를 끌어내 노를 젓고 있는데 그때 머리가 허연 한 미친 사내(백수광부)가 머리를 풀어 헤친 채 술병을 들고 다짜고짜 강물에 뛰어 들어 건너려 하자 그의 부인이 쫓아가서 말렸지만 미치지 못해서 결국 강물에 빠져 죽고 말았다. 그래서 그의 아내가 공후를 들고 연주해 <공무도하>라는 곡을 지었는데, 그 소리가 몹시 처량하고 구슬펐다. 그녀는 곡을 마치고 스스로 강에 몸을 던져 죽었다. 곽리자고가 집으로 돌아와서 그 노랫소리를 아내 여옥에게 말해주었더니, 여옥이 슬퍼하며 이내 공후를 끌어당겨 그 노랫소리를 따라 연주했는데, 듣는 사람 중에 눈물을 떨구고 울음을 삼키지 않는 자가 없었다. 여옥은 그 곡을 이웃 여자 여용에게 전해 주고 이름하여 <공후인>이라 했다. (사회평론, 고전시가작품론, 16~17쪽)
3. <공부도하가>가 전하는 인간 존재의 보편적 문제
사랑하는 사람과의 이별
인간 존재의 유한성
기존 질서의 붕괴와 새로운 질서의 출현
4. ‘물’의 이미지
1행의 ’물‘은 화자의 염려를 통해 임을 향한 사랑을 드러내는 장치로, 2행의 ’물‘은 임의 부재 즉, 이별이 발생할 것임을 나타내는 소재로, 3행의 ‘물’은 임의 죽음을 발생시키는 소재로 작용한다.
4행에서는 이러한 임과의 이별, 임의 죽음을 체념하듯이 받아들이며 어찌할 수 없는 불가항력적 상황에 대한 체념적 태도가 나타난다.
‘물’은 죽음과 동시에 재생을 상징하는 소재로 많이 사용된다. 춘향전의 ‘물’ 역시 춘향이가 아비의 눈을 구하기 위해 인당수에 빠지며 죽음에 이르지만 결국 용궁에서 재생, 불화의 시퀀스가 존재하는 것은 죽음과 동시에 재생의 상징을 드러낸다. 이러한 죽음과 재생의 상징적 의미를 가져와 <공무도하가>의 임이 물에 빠져 죽는 이 상황에 대해서 확대 해석해본다면, 기존 질서의 붕괴로 끝나는 것이 아닌 새로운 질서의 탄생을 위한 통과의례적인 행위로 이해해 볼 수 있을 것이다.
5. 백수 광부와 아내의 정체
1) 백수 광부 = 신화적 존재, 주신
백수 광부를 술의 신, 주신으로 보는 견해가 있다. 신화적 질서가 흔들리면서 새로운 질서가 나타나는 상황으로 해석한다.
2) 백수 광부 = 무당
머리가 흰 미친 사람이라는 뜻의 ‘백수 광부’는 무당이라는 견해가 일반적이다. 이 견해에서는 고조선이 국가의 체계를 이루어서 권위를 상실한 나라 무당이 죽음을 택한 것으로 해석한다.
3) 백수 광부 = 가난에 시달려 죽음을 택한 사람
백수 광부를 일상적 인물로 바라본다면 가난함을 이기지 못해 결국 죽음을 택하는 안타까운 인물로 이해할 수 있다.